한전은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파수 조정용 ESS를 최근 개발했다. 지난해 12월 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개최한 ESS 온실가스 저감 국제 워크숍 발표 중 한국전력연구원 임건표 박사의 한전의 주파수 조정용 ESS 사업화 연구내용 및 결과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 임건표 박사
우리나라는 연료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때 드는 전력 요금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발전 단가를 줄이고 전력 요금을 절감 수 있는 ESS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파수 조정용 ESS를 개발했다.
2015년에 52MW의 ESS를, 2016년 상반기에는 184MW ESS를 건설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건설중인 140MW ESS는 2017년 6월경에 상업화할 예정이다. 또 2017년에 124MW ESS 설비가 착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전에서 진행하는 전체 500MW 주파수 추정 서비스 ESS를 사업화하는 계획이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주파수 조정용 ESS로는 서안성의 28MW 주파수 조정용 ESS, 신용인의 24MW 주파수 조정용 ESS, 경산의 48MW 주파수 조정용 ESS가 설치돼 있다.

제주도 조천 변전소에 실증단지 준공
한전은 4MW 주파수 조정용 ESS에 운영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기 전인 2013년 10월, 제주도 조천 변전소에 실증단지를 준공했다. 이 설비와 관련해 주파수 조정용이나 피크셰이핑, 신재생 출력 시험 또한 마쳤다. 제주도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일부 에너지관리공단과 풍력단지와 연결돼있는 풍력 설비와 연계해 풍력시험도 거치며 운영기술이 개발됐다.
제주도에서 개발했던 운영시스템은제어 알고리즘이 설치돼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전 화면을 분석할 수 있으며 유지 정비를 할 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또 개통과 연계하기 위한 주파수와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와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전력충방전 시스템은 PMS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PCS를 제어한다. PMS(Power Managment System)는 모든 ESS와 개통사항을 고려해 충방전하는 전력, 배터리를 어떻게 계속 운전할 것인지 충전상태를 유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ESS다.
ESS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부서를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 보통 변전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변전소에서 개통과 연계할 것인지, 네트워크 망, 자동제어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각 설비들이 PCS 배터리에 순차제로 하기 위한 CPS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립해야 한다.
기존에 발전기들이 주파수를 측정할 때 부터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따라서 발전기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로드가 편차가 생기면 터빈제어기에서 필요한 전력을 계산해야 한다.
실제로 발전기들이 주파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PCS와 배터리로 전체 루프를 돌리고 있다.
제주도 도처 빌딩에서는 주파수 조정서비스가 가능하다. 개통을 고장내고 실험험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이 났을 때 가상의 주파수를 준 다음에 ESS가 원하는 속도로 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실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ESS의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시험을 한다. 한전은 여러 가지 실증단계를 거쳐 2014년 8월에 실험과정을 마쳤고 2016년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을 2016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안성, 신용인 변전소의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은 FRC가 4MW 단위의 제어기가 된다. 이는 200ms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어기 하나가 ESS 배터리를 운영하기 위한 용량을 제한한다. 그래서 하부적 기기가 있고, 배터리 별로 충방전을 동일하게 해도 배터리의 특성에 따라서 충전량을 일률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최상위자로서 감시했다가 하위의 여러개 제어기에 차이나는 것들을 고려해 명령을 내려 PCS와 배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
현재는 한전 본사에 13개의 변전소에 ESS를 통합 운영하는 설비가 설치돼 있고 현재는 감시단계만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하게 될 것이다. NPMS가 바로 그 설비로 현장에 지금 설치해놓은 ESS 운전 화면중에 한 화면이다.
FRCM은 전체 ESS의 마스터 운영시스템으로, 다른 운영결함이나 개통도 4MW 단위로 제어하며 운영시스템, PCS나 배터리 상태, 경보, 트렌드, 보고서, 네트워크 상태,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화면이다. 또 PMNL 전체 성능을 평가하는 화면에 띄우고 있으며 ESS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전메카니즘 또한 개발돼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운전원들의 조작 없이도 완전 자동화 운전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제어기 코딩에 따라 C베이스로 개발되면서 PSS 개통에서 툴과 연계해서 랩에서 시험한다.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어기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변전소에서 ESS와 연계해 시험하는 것처럼 실험을 한 뒤에 현장에서 시험하는 절차를 밟는다. 단계별로 안전하게 계통을 연계해 무고장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를 걸쳐 개발한다.
그리고 전력연구원에서 사업화 하기 위해 PCS와 배터리로 실제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PCS와 배터리, 전력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개발해 시험을 완료했다. 그리고 검증하고 시험하는 것은 PSSE를 통한 프로그램 내에서 정상상태 시뮬레이션, 과도상태 시뮬레이션, SOC를 유지하는 시험, 그리고 장기간 동안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제어기 자체에서 정상상태, 과도상태 등을 시험에 진행한다.
또한 조천변전소에서 실제 배터리하고 연계해 운전할 때 여러가지 시스템적 문제를 실제 사업화한다. 개통이나 제어기 자체의 통신, 운전 메커니즘 등을 시험을 통해 사업화한다.
발전기의 주파수용 서비스를 대체하는 ESS 목적에 따라 발전기를 대체해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파라미터를 조정해 확인한다. ESS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대체하고자 하는 발전소의 속도와는 비슷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속도조정률을 14배 가까이 빠르게 만든 시험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 리얼타임으로 시뮬레이터와 운전하면서 고장사항이나 통신 고장, 제어고장, 그리고 PCS, 배터리 개통에서의 고장 등을 실험실에서 시험하고 절차화한다. 이밖에도 주파수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파수 변동량에 따른 출력을 조정할 수 있게끔 거래소나 한전본사,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서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어 현재까지 운영시스템 측면에서는 2015년에 시작한 건설 사업화 이후로 단 한건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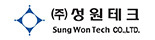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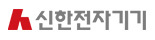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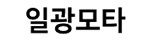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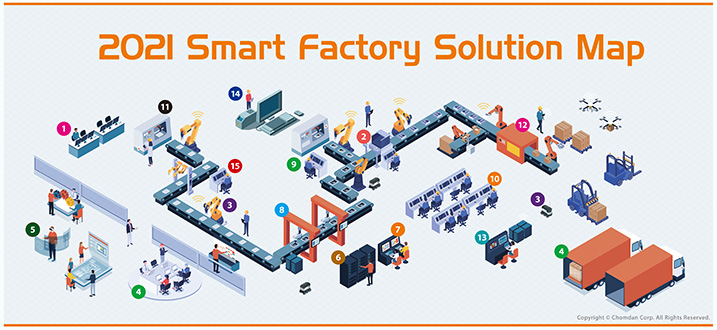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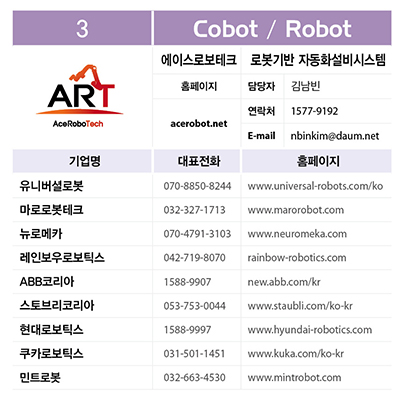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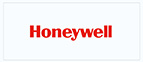


/pdf.png)
/smartmap_2_01.png)
/smartmap_2_04.png)
/smartmap_2_big_04.jpg)
/smartmap_2_05.png)
/smartmap_2_big_05.jpg)
/smartmap_2_08.png)
/smartmap_2_big_09.jpg)
/smartmap_2_09_2.png)
/smartmap_2_big_10_2.jpg)


/smartmap_2_11_2.png)
/smartmap_2_big_12_2.jpg)
/smartmap_2_02.png)
/smartmap_2_03.png)
/smartmap_2_06.png)
/smartmap_2_big_07.jpg)
/smartmap_2_07.png)
/smartmap_2_big_08.jpg)
/smartmap_2_12.png)
/smartmap_2_big_13.jpg)
/smartmap_2_13.png)
/smartmap_2_big_14.jpg)
/smartmap_2_14.png)
/smartmap_2_big_15.jpg)
/smartmap_2_15.png)
/smartmap_2_big_16.jpg)
/smartmap_2_16.png)
/smartmap_2_big_17.jpg)
/smartmap_2_17_2.png)
/smartmap_2_big_18_2.jpg)
/smartmap_2_18_2.png)
/smartmap_2_big_19_2.jpg)
/smartmap_2_19._2.png)
/smartmap_2_big_20_2.jpg)
/smartmap_2_20.png)
/smartmap_2_big_21.jpg)
/smartmap_2_21.png)
/smartmap_2_22.png)
/smartmap_2_23.png)
/smartmap_2_24.png)
/smartmap_2_25.png)
/smartmap_2_26.png)
/smartmap_2_27.jpg)